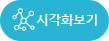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5602083 |
|---|---|
| 한자 | 萬淵寺 |
| 분야 | 구비 전승·언어·문학/문학 |
| 유형 | 작품/문학 작품 |
| 지역 |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367[동구리 179] |
| 시대 | 고려/고려 후기,조선/조선 후기 |
| 집필자 | 김미선 |
[정의]
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에 있는 만연사에 대해 혜심, 유일, 조엽 등이 읊은 한시.
[개설]
시의 배경인 만연사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만연산에 있는 절로, 1208년(고려 희종 4)에 창건되었다. 화순군에 있는 대표적인 사찰의 하나로 진각 국사 혜심(慧諶)[1178~1234], 연담 선사 유일(有一)[1720~1799], 조엽(曺熀) 등이 만연사에 대해 읊은 시가 남아 있다. 혜심과 유일은 모두 화순 지역 출신의 승려인데, 그 중 혜심이 만연사를 창건했다고 알려지고 있다. 조엽은 조선 인조 때에 진사에 합격하였던 화순 출신 인물로, 병자호란 때 창의하였다가 인조가 청 태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다.
[구성]
혜심의 시 「만연사(萬淵寺)」는 칠언 절구의 짧은 시로, 만연사 터의 과거 역사를 추억하고 있다. 유일의 시 「만연사에 머물러 감회를 적다」는 칠언시로 30년 만에 고향 화순에 와서 변한 것을 보고 느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. 조엽의 시 「만연사 홍한림 운을 빌려」는 칠언 절구로 만연사에서 보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.
[내용]
「만연사(萬淵寺)」 / 혜심
초창하인점차기(草創何人占此基)[맨 처음 그 뉘가 이 터를 잡았던고]
기회성괴기흥쇠(幾回成壞幾興衰)[흥망성쇠인들 그 몇 번이더뇨]
유유천만년래사(悠悠千萬年來事)[유유히 흘러간 천년의 사연들이여]
유유문전고회지(惟有門前古檜知)[오직 문전의 옛 회나무만 알고 있으리]
「주만연사감회(住萬淵寺感懷)」[만연사에 머물러 감회를 적다] / 유일
삼십년래반고향(三十年來返故鄕)[삼십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]
안중무처불비상(眼中無處不悲傷)[눈앞의 모든 것이 슬픔뿐일세]
상마구택수위주(桑麻舊宅誰爲主)[뽕과 삼을 심던 옛집은 누가 사는지]
죽마붕주반이망(竹馬朋儔半已亡)[죽마 타던 옛 친구 반이나 가버렸네]
기아언음유건눌(記我言音猶謇訥)[내 말소리 더듬더듬 기억에서 찾고]
악린수발정창랑(愕隣鬚髮政愴浪)[옛 이웃은 백발 되어 붙들고 우네]
독희오방문헌족(獨喜吾邦文獻足)[그러나 즐겁게도 학문하는 이 많아]
승간제자비성장(勝看諸子斐成章)[후배들이 이룬 일들 흐뭇하더라]
「만연사차홍한림운(萬淵寺次洪翰林韻)」[만연사 홍한림 운을 빌려] / 조엽
답파태암금수봉(踏破苔巖錦繡縫)[푸른 이끼 비단 수놓은 바위를 밟고 서니]
의연풍안구시종(依然楓岸舊時鍾)[단풍 숲 언덕에 옛 종소리 은은하다]
연하십리음난진(烟霞十里吟難盡)[십리길 산수 경치 어찌 다 읊어내랴]
도의고루대석봉(徒倚高樓對石峯)[높은 누각에 기대어 봉우리만 바라보네]
[특징]
혜심의 시는 쇠(衰)와 지(知)의 운자를 사용하였고, 유일의 시는 상(傷), 망(亡), 낭(浪), 장(章)의 운자를 사용하였다. 조엽의 시는 종(鍾)과 봉(峯)의 운자를 사용하였다.
[의의와 평가]
화순 지역 출신 인물들이 만연사에 대해 시를 남겨 고향 절에 대한 관심을 알 수가 있다. 여러 명의 시가 남아 있어 과거 역사부터 당대의 풍경까지 만연사에 관한 다양한 면모를 시로 볼 수가 있다. 특히 혜심의 시는 창건 초기의 시이지만 시의 내용을 통해 절터의 과거 역사까지 회고할 수가 있다. 만연사는 1208년에 창건되었지만, 유래를 보면 이미 그 전에 암자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