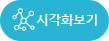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5601978 |
|---|---|
| 분야 | 구비 전승·언어·문학/구비 전승,문화유산/무형 유산 |
| 유형 | 작품/민요와 무가 |
| 지역 | 전라남도 화순군 |
| 집필자 | 이옥희 |
[정의]
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에서 전승된 집짓기 노래.
[개설]
집은 인간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이다. 이사가 흔하지 않았던 전통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다. 현대에는 집을 짓는 건설업체가 따로 존재하지만 예전에는 전문적인 기술자를 제외하고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집을 짓는 과정에 동참했다. 농사일을 할 때 두레를 만들어 들노래를 불렀듯이 집을 지을 때는 집짓기 노래를 불렀다.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작업의 능률을 높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도록 해주었다.
[채록/수집 상황]
1993년 『화순의 민요』에서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에서 전승되었던 집짓기 노래가 채록되었다.
[내용]
집짓기 노래는 무거운 짐을 나를 때 부르는 목도 노래, 집터를 다질 때 부르는 지경돋우기 노래, 흙을 고를 때 부르는 가래질 노래, 상량을 할 때 부르는 상량 노래, 성주를 올릴 때 부르는 성주 노래 등 집짓기 전 과정에 관한 노래가 수록되어 있어 매우 긴요한 자료이다. 채보는 되어있지 않고 가사만 수록되어 있다.
1. 목도 노래
아아 어기엉차/ 뫼시여라 뫼시여라 어아 어기엉차/ 수신을 뫼시여라 어아 어기엉차/ 당상학발 천년수라 어아 어기엉차/ 영웅호걸 뫼시여라 어아 어기엉차/ 시중천자 뫼시여라 어아 어기엉차
2. 지경 돋우기 노래
에헤야 상사뒤야/ 가만히 들었다 꽝꽝 놓게 에헤야 상사뒤야/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에헤야 상사뒤야/ 여기 조기 골고루 찍어보세/ 무등 줄기 능주 벌판에 에헤야 상사뒤야/ 기암절벽이 부귀영화라 에헤야 상사뒤야/ 명당이로다 우리 자리가 에헤야 상사뒤야/ 만수무강할 명당일세 에헤야 상사뒤야
3. 가래질 노래
우겨라 어와 어기 영차/ 이 가래로 들보 밑도 골라보세 우겨라 어와 어기 영차/ 높은데 가서 흙을 파 깊은데 고르고 우겨라 어와 어기 영차/ 서로 힘을 모아 기운차게 잡아 당기세 우겨라 어와 어기 영차/ 우리 모두가 상량 밑도 골라보고 우겨라 어와 어기 영차/ 이 가래로 들보 밑도 골라 보세 우겨라 어와 어기 영차
4. 상량 노래
어기영차 상량이여 상량/ 상량이로다 얼 널 얼 널 상사듸여 어기영차 상량이여 상량/ 이 상량을 올리면은 조상님이 굽어살펴 어기영차 상량이여 상량/ 선조음덕 충만하고 자손창성 영화로다 어기영차 상량이여 상량/ 태산같은 높은 명과 하해같은 깊은 복을/ 이 댁으로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어이경차 상량이여 상량
5. 성주 노래
노자단실 성주로다/ 아그래 단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다/ 노자단실 성주로다/ 이 성주를 지을 적에 서른 세명 역군들이/ 노자단실 성주로다/ 금도끼로 찍어내고 은도끼로 다듬어서/ 노자단실 성주로다/ 인의예지 주초 놓고 효제충신 기둥삼아/ 노자단실 성주로다/ 육십팔괘 삼백팔십사괘를 놓아보세/ 노자단실 성주로다[『화순의 민요』, 1984, 능주면 잠정리, 조신원·이창호·최삼봉]
[의의와 평가]
집짓기 민요는 전통사회에서는 전국에서 불리워진 민요이지만 가옥 및 건축 방식이 현대화되면서 점차 자취를 감춘 민요이다. 그런 가운데 집짓기 민요가 능주면에서 채록이 되었다는 점은 능주가 지닌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. 능주는 옛 목사고을로서 능주향교,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, 죽수절제아문, 능주 삼충각 등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한 지역이다. 또한 큰 규모의 전통 가옥이 지금까지도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가장 늦게까지 집짓기 민요가 전승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.
- 강동원, 『화순의 민요』(도서 출판 민, 1993)